캐나다(Canada)속의 작은 프랑스, 퀘벡시티(Quebec City) 탐방기(1)
2006-08-02
이재명 : ledclone
- 8431
- 1
- 1
1. 캐나다에 대한 생각




퀘백주를 상징하는 기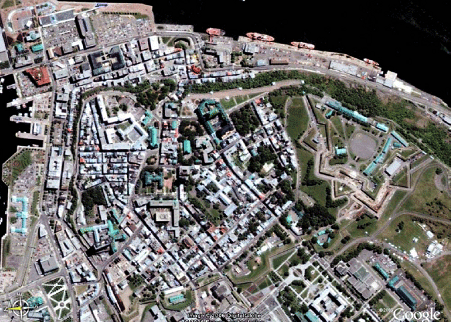
구 퀘백시티의 인공위성 사진. 위가 동, 우측이 서쪽임.

신시가지의 모습. 위 사진은 아침식사 중에 바라본 시청의 모습, 아래는 햄버거가게인 버거킹의 모습이다.




퀘백주를 상징하는 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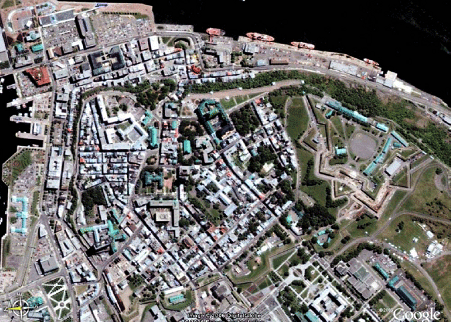
구 퀘백시티의 인공위성 사진. 위가 동, 우측이 서쪽임.


신시가지의 모습. 위 사진은 아침식사 중에 바라본 시청의 모습, 아래는 햄버거가게인 버거킹의 모습이다.



캐나다 퀘벡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예전 독립도 시도했었던거로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배웠었고.
목적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홧팅!